독일
아리랑 무용단, 우리들의 이야기 춤으로 표현
by 유로저널 posted Aug 01, 2010


아리랑 무용단, 우리들의 이야기 춤으로 표현
‘아직은 서투른 걸음걸이입니다.
앉아만 있던 아이들이 일어서게 되어 신기해 하며 한발 한발 디디며 걸음마를 배우듯 우리들도 그저 우리 고유의 장단에 맞춰 한발 한발 앞으로 떼어 놓으며 시작한 춤들입니다.’ 서정숙 아리랑 무용단장이 감사의 글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와 뒷받침이 함께 했음을 감사했다.
하나 둘씩 모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에쎈(파독광부회관)과 도르트문트(오케스트라젠트룸)에서는 아리랑 무용단 발표회가 있었다.
1996년 1월 11명이 도르트문트에 모여 시작된 아리랑 무용단은 그 동안 취미로 배운 춤을 수줍은 마음으로 많은 지인과 교민, 외국인들에게 선보였다.
23일 7시부터 시작된 발표회의 사회는 그 동안 꾸준히 지도해 온 고진성 교수가 차분한 설명과 함께 진행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입춤>은 여인의 멋스러운 동작을 구석구석 잘 표현한 춤으로 한바탕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춤사위 마다 우리의 멋이 한껏 베어 있는 작품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아리랑 무용단은 진분홍 치마와 빨간 고름이 달린 초록색 저고리에 삿갓모를 쓰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껏 뽑냈다.
두번째 흥춤은 경남지방의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춤으로 인간 문화재 우봉 이재방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남성들이 주로 추는 한량무를 여성의 춤으로 재구성 변화시킨 작품이다. 흥춤은 손 끝과 손 끝이 만나는 선이 크고, 부채를 짝 피었다 접었다 하는 소리가 흥을 저절로 불러와 보는 관객들도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다.
세번째 춘앵무는 조선시대의 궁중무용으로 조선 28대 순조 때 효명세자가 어머니 숙원황후의 보령 60세 생일을 축하 하기 위해, 봄에 꾀꼬리가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황초 환삼 옷을 입고 추는 이 춤은 황초 즉 노란 옷을 입은 이유는 노란 꾀꼬리를 뜻하며, 환삼을 손목에 낀 이유는 왕 앞에서 살결을 보이지 않도록 손과 발을 가리기 위해서 이며 쪽도리를 쓰고 파란 치마에 노란 앵삼 (윗도리)가 어울리고 형형색색의 의상이 아름답고 황홀했으며 고요하고 우아한 정적인 춤이었다.
네번째 살풀이는 느린 장단에 맞추어 흰 명주 수건을 들고 한을 흥과 멋으로 승화시키는 이중구조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춤으로 수건으로 만들어내는 공간미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
다섯번째 사랑가는 춘향가중의 한 대목으로 한국민들의 가장 서정적인 사랑의 노래이다. 춘향과 이도령이 달밤에 남 몰래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멋진 장면이었다. 댕기 머리의 춘향이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었고 이는 처녀라는 것을 뜻한다.
첩지(여자 머리에 꽃은 장식품)는 양반집 규수를 뜻하며 옷 고름의 위치와 한복의 악세사리로 양반계급, 천민계급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며 사회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여섯번째 수건산조는 하얀 치마 저고리에 하얀 수건으로 하늘 하늘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백조와 같은 기분이 드는 백의 민족의 순수함이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
산조는 서양악의 재즈와 같은 것으로 4/4 박자의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는 곡으로 가야금 산조가 동반되었다.
일곱 번째 부채산조는 섬세하고 화려한 선율과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우리 음악에 맞추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한복의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버선을 사뿐하고 가볍게 움직여 아름다운 여성의 교태미와 순백의 미를 나타내는 한국 고유의 전통 춤이다.
여덟 번째 소고와 장고춤은 일부 순서의 마지막으로 소고는 6인의 단원이 하얀치마 저고리에 금박이 박힌 연초록 괘자를 입고 농악에 맞쳐 소고를 들고 추었고 이어 장고춤은 5인의 단원이 장고를 메고 굿거리, 동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부드럽게 추다가 자진모리, 휘몰이 장단으로 흥겹게 추면서 1부 순서가 끝났다.
2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2부 순서로 아홉번째 굿거리 춤은 진분홍 치마에 하얀 고름이 달린 연초록의 저고리를 입은 9인의 단원이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자연스런 호흡에 알맞게 편하게 추었다.
열 번째 신칼대무는 마치 내림굿을 하듯 신칼에 하얀 한지 종이를 잘게 썰어 양쪽 칼끝에 붙어 있는 하얀 신칼을 양쪽 손에 각각 한개씩 쥐고 하얀 의상에 신칼을 흔들며 추는 춤은 마치 천사가 내려와 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전(한지)으로 만든 신칼로 하늘의 기운을 모으고 발디딤으로 땅의 기운을 이끌어 천지의 기운이 춤꾼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며 솟아나는 표현을 잘 묘사한 춤이다. 신칼을 흔들 때 나는 소리는 나쁜 귀신을 쫓는다고 한다.
열 한번째 부채춤은 무용가들의 동작에 따라 부채를 펴고 접고 돌리면서 아름다운 꽃 모양을 만들거나 파도 모양을 만드는 다양하고 이색적으로 변형하는 모습과 화려한 의상에 관객들의 많은 박수 갈채와 환호성을 받았다.
이 부채춤은 1954년 김백봉 선생님이 창작하여 서울시공관에서 처음으로 독무 공연을 보여준 이래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 세계 민속예술 축제에서 단체공연으로 재구성 되어 국내외에 많이 알려진 춤이다.
열 두번째 순서로 고진성 선생님이 준비하신 보기 쉽지 않은 승무는 공연장소의 천정이 낮은 관계로 유감스럽게도 공연 할 수가 없었다.
승무대신 삼고무가 서울에서 온 강영희, 유성숙 선생님으로부터 공연되었다.
열 세번째 북모듬은 북을 이용한 타악 작품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어울림의 조화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소리의 화합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11인의 춤꾼이 치는 모듬북 소리는 웅장했고 빠른 장단에 움직이는 손놀림이 조화를 이루어 절정에 달하였으며 보는 관객들의 신명을 한층 더 높여 주며 재청으로 다시 한번 북모듬 소리로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공연이 끝났다.
고진성 사회자는 이렇게 화려한 의상으로 아름답게 분장한 출연자들의 이면엔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어르신들의 각종 신체적인 아픔들이 또한 숨겨져 있다는 설명에 관중들은 그들의 노력에 또한번 놀라워했다.
한편 23일 재독한인문화회관에서의 공연에서 예상외로 독일인들이 많이 참석한 걸 본 보흠의 윤행자 원로가 즉흥적인 통역을 맡아 수고해 주었으며, 24일 도르트문트 공연에서는 박정숙 무용단의 딸인 채송화 양이 고진성 사회자의 통역에 수고했다.
취미로 시작했던 아리랑 무용단이 프로에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모두들 감탄하고 격려했으며 우리나라의 고전무용의 맛에 흠뻑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출연진: 서정숙, 김혜숙, 박연희, 최녹부, 권선미, 서신선, 이량자, 정인숙, 박정숙
(자료제공:박명성)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
mt.1991@hotmail.com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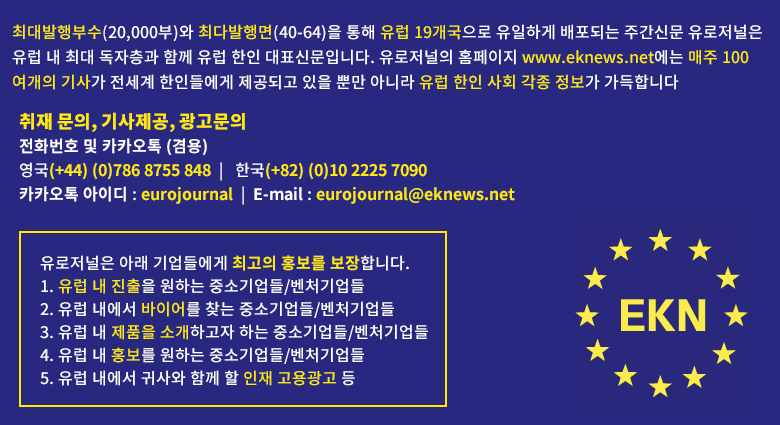
Articles
-
 3백만명 방문하는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에서 프랑크푸트한인합창단 공연
3백만명 방문하는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에서 프랑크푸트한인합창단 공연
-
 홍상수 감독 영국 25개 도시 순회 회고전
홍상수 감독 영국 25개 도시 순회 회고전
-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독일 KOWIN-Germany:함부르크에서 회장단 회의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독일 KOWIN-Germany:함부르크에서 회장단 회의
-
 2010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54개국 172명 참석,
2010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54개국 172명 참석,
-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옛 광부들 40 여년만에 독일 방문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옛 광부들 40 여년만에 독일 방문
-
 제65회 광복절 기념 파독산업전사 제3차 세계대회
제65회 광복절 기념 파독산업전사 제3차 세계대회
-
 오스트리아 , 광복절 행사 및 체육대회 성대히 개최
오스트리아 , 광복절 행사 및 체육대회 성대히 개최
- '2010 KOREAN FESTIVAL' 성대하게 개최 !
-
 런던한국학교 이사회 개최 - 채수석 신임이사장 선임
런던한국학교 이사회 개최 - 채수석 신임이사장 선임
-
 한반도 평화통일 축구대회 열려
한반도 평화통일 축구대회 열려
-
 남부독일한인회장단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남부독일한인회장단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
 제31대 재독한인총연합회 제2차 임원회 및 자문위원상견례
제31대 재독한인총연합회 제2차 임원회 및 자문위원상견례
-
 마인츠 한- 독 협회 25 주년 창립 기념행사-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마쳐
마인츠 한- 독 협회 25 주년 창립 기념행사-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마쳐
-
 해동검도 세계대회,독일 최무도장팀 최고 실력 나타내
해동검도 세계대회,독일 최무도장팀 최고 실력 나타내
- 유럽 내 모의 재외선거 실시,적극 참여 필요
-
 aT, 영국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개최
aT, 영국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개최
-
 재외 국민 선거 설명회
재외 국민 선거 설명회
-
 U20 독일과 한국 여자축구 준준결승전
U20 독일과 한국 여자축구 준준결승전
-
 재독체육회 회장단 대사관방문
재독체육회 회장단 대사관방문
-
 재독한국문인회, 한국정원에서 시 낭송회 개최
재독한국문인회, 한국정원에서 시 낭송회 개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